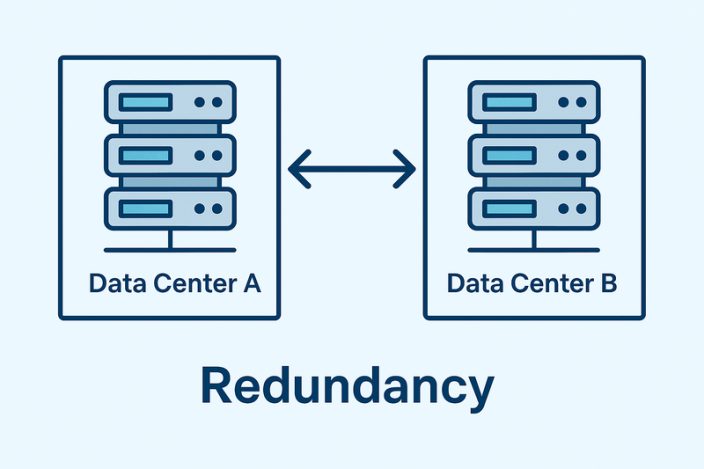최근 한국에서 국가 전산망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중화와 분산화가 잘 갖춰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한 사례도 있어 대비책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2021년 3월 프랑스에서는 유럽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OVH클라우드의 스트라스부르 데이터센터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
전체 데이터센터 한 동이 전소되고 일부 건물이 손상되면서 정부 기관과 기업 웹사이트가 일제히 다운됐다.
당시 피해를 본 고객 중 다중 데이터센터와 리전 분산 전략을 사용한 경우는 비교적 빠르게 복구할 수 있었지만, 단일센터 의존도가 높았던 기관은 장기간 업무 차질을 겪었다.
개도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됐다.
2021년 나이지리아 선거관리위원회(INEC) 데이터 처리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장비가 전소됐지만, 별도 백업 덕분에 선거 데이터 손실은 없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올해 6월 인도 콜카타의 정부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지방선거 개표가 일시 중단되었고, 같은 해 9월 인도 자르칸드주의 경찰 데이터센터도 불에 휩싸여 설비와 기록물이 손상됐다.
다만 이 경우 긴급 대체 체계를 통해 핵심 치안 서비스는 마비를 피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해외 사례는 화재 자체는 피할 수 없더라도,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 피해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물리적으로 수백 km 떨어진 거점 간 액티브-액티브 구성, 리튬이온 배터리실의 방화 설계, 오프사이트 백업, 정기적인 재해복구 훈련을 최소 요건으로 꼽는다.
한국의 국가 전산망 화재 사태를 계기로, 해외에서 반복된 경고를 참고한 체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일 시설에 집중된 전산 자원을 분산시키고, 실제로 전환·복구가 작동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일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