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난항을 거듭하던 관세 협상에서 23일 타결점을 찾았다.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와 농산품 등에 대해 15%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고, 일본은 농식품 시장 개방 및 대미 투자 확대(5,500억 달러)를 약속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역대 최대 무역 성과”라며 환영했고, 일본은 “국익 우선의 전략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이번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 속에서 협상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점에서 시장과 정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과 영향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국제금융센터(KCIF) 최호상 전문위원은 23일 ‘미일 관세 협상 타결 시장 평가와 일본경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번 협상 타결이 일본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기존 25% 부과 가능성이 제기됐던 관세가 15%로 설정되면서 기업 부담이 줄었고,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유인도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물가·임금 등 실물 지표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해 일본은행은 당분간 관망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최 위원은 “참의원 선거 패배 후 정치적 부담이 컸던 이시바 총리에게 정치적 안정의 기회를 제공한 셈”이라며 “무역환경 변화가 신용등급과 재정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신·전문가 평가, 성과인가, 양보인가
글로벌 평가는 엇갈린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주의 틀을 허문 역사적 합의”라고 전하며, 일본이 자동차 수출에 대한 수량 제한 없이 관세율을 확정지은 점에 주목했다.
반면 미국 완성차 업계는 “일본차만 혜택을 받고 미국산 차량은 불리해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CSIS는 “이번 협상이 새로운 관세 기준선(benchmark)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며 일본이 한·중 등 타국 대비 ‘미국에 선제 대응한 외교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반면 Politico는 “15% 관세는 여전히 높으며, 민주당 지지층을 겨냥한 농산품 개방이 미국의 정치적 계산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편집자 의견
한국 입장에선 이번 미일 협상에 과도하게 휘둘릴 필요는 없다.
일본은 선거 직후 정치적 명분 확보 차원에서 빠르게 타결을 택했지만, 그만큼 구조적 양보도 컸다.
이에 반해 한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중도 실용외교’를 국정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왔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도한 속도전이 아닌, 전략적 여유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통상현안은 조선, 배터리, 에너지 분야 등 일본과는 다르다.
협상의 논점과 판이 다른 만큼, 단기 협상 프레임이 아닌 중장기 국익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외교는 ‘페이스’다. 상대 리듬에 말리지 않고 우리 속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외교의 기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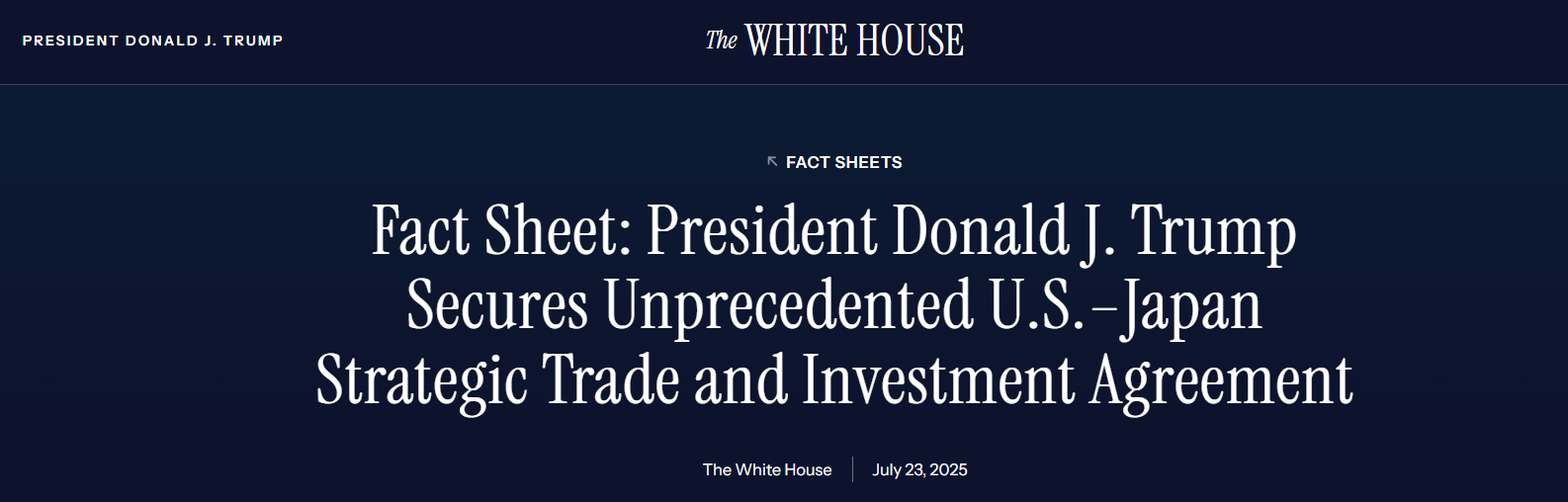
단기 협상 프레임이 아닌 중장기 국익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