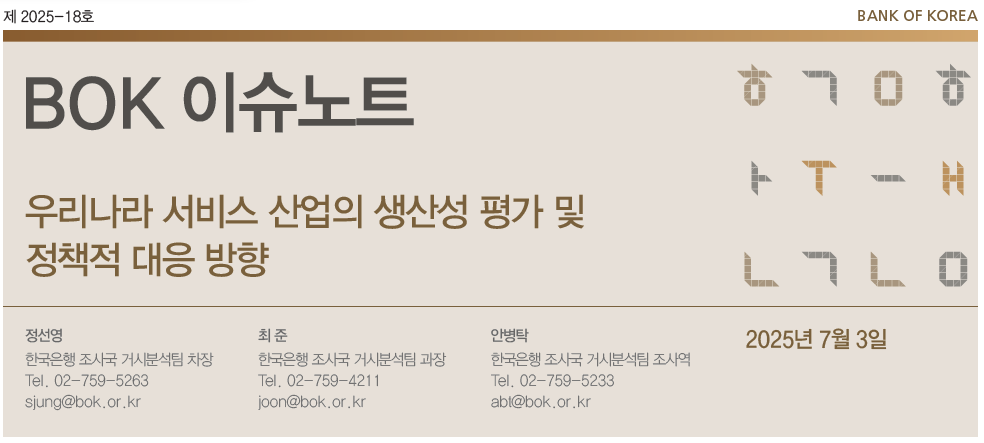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이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산성과 효율성 면에서는 여전히 정체돼 있으며, 특히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조차 팬데믹 이후 장기 추세를 밑돌고 있다고 진단했다.
3일 발표된 한국은행 조사국의 이슈노트(제2025-18호)에서 정선영 거시분석팀 차장, 최준 과장, 안병탁 조사역은 “서비스업이 GDP의 44%, 취업자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확대됐지만, 1인당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팬데믹 이후에도 생산성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 흐름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초기에 비대면 수요 확대의 영향으로 금융보험,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2022년 이후 하락세로 전환됐고 최근에는 팬데믹 이전의 장기 추세를 약 10% 하회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반면 미국은 IT 및 인공지능 수요 증가를 발판으로 같은 분야에서 생산성을 오히려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선영 차장 등은 “고부가 서비스업의 생산성 하락은 단지 근로시간 감소 때문이 아니라, 인적·물적 자본 축적 부진, 기술 도입 정체, 자원 활용도 저하 등 구조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저부가가치 업종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도소매, 숙박음식, 운수창고업 등은 팬데믹 직후 생산성이 급락한 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과거 추세 대비 7%가량 낮은 수준이다.
특히 숙박음식업 등 노동집약적인 업종은 “노동 투입 감소가 곧바로 생산성 정체로 이어지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생산성 정체의 원인으로 △서비스업을 제조업의 보조나 공공재로 인식해온 정책적 환경, △내수 및 공공부문에 치우친 고부가 서비스 구조, △생계형 자영업 간 회전문식 경쟁 고착화를 꼽았다.
특히 우리나라 지식서비스 기업 중 해외시장 진출 경험이 있는 곳은 2021년 기준 2.2%에 불과하며, 전체 매출의 98%가 국내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해외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선진국 기업들과 대조된다.
보고서는 정책 방향으로 △신산업을 포괄하는 법·제도 정비(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제조업과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 서비스 수출 전략, △자영업의 법인화 및 중견기업 중심의 일자리 전환 등을 제안했다.
정 차장 등은 “서비스업을 더 이상 내수 보조산업이 아닌 고부가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산업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